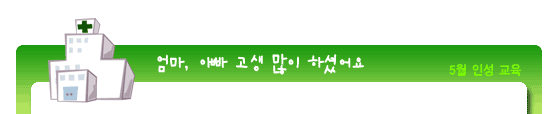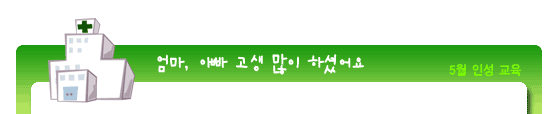|
강원도 산골 목장에 살고 있던 소년은 백혈병이 다시 나타나서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. 건강한 또래의 소년이라면
중학교에 입학에 한껏 부풀어 있을 때였지만 초등 학교 1학년 때 백혈병을 앓기 시작하여 이제껏 병원을 들락거리느라
소년은 학교도 제대로 다녀 보지 못했다.
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눈을 뜬 아침, 소년은 엄마에게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졸랐다. 휠체어를
타고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서자 소년은 의사 선생님과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면 한사코 엄마를 밖으로 밀어냈다.
독한 약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얼굴도 노랗게 부어 올랐지만 소년의 눈만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.
“선생님, 저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, ……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나를 기증하고
싶어요……”
소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안 의사 선생님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보드라운 소년의 머리털을 쓰다듬어 줄뿐이었다.
밖에서 얘기를 엿듣고 있던 엄마는 숨죽여 울고 있었다.
같은 병동의 어린이 환자들이 하나 둘 숨을 거둬 빈자리가 늘어갈 때에도 소년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쾌활함을 잃지
않았다. 그러던 소년도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. 의식불명 상태가 된 지 하루 이틀……
시간은 점점 흐르고 소년의 부모의 애절한 바램은 더욱 커져 갔다.
열흘째 되던 날 소년이 가느다랗게 눈을 떴다. 곁에 있던 엄마와 아빠가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바싹 다가서자 소년은
입술을 힘겹게 움직이며 말했다.
|